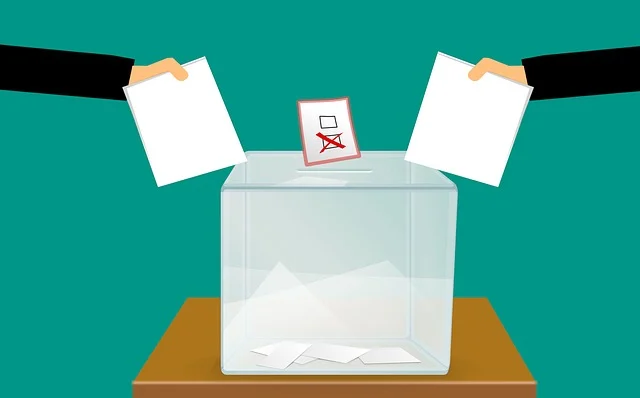
국민은 언제 주인이 되는가
– 선거와 민심, 그 짧은 순간의 권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의 문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그 권력은 과연, 언제 우리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가?
투표일 하루, 우리는 ‘주인’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주권자이며, 나라의 주인이다.
하지만 실감나는 ‘주인됨’은
오직 투표하는 그 하루에만 느껴진다.
평소에는
- 정책이 결정될 때,
- 세금이 쓰일 때,
- 법이 만들어질 때조차
우리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말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
선거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
선거는
4년 또는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주권의 발현 순간이다.
이 짧은 순간 동안
- 우리가 던지는 한 표가
- 거대한 권력의 향방을 바꾸고,
- 수천억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며,
- 미래 세대의 삶을 짓는다.
단 하루, 단 몇 분
그 짧은 ‘기표소 안’에서
우리는 진짜 ‘권력자’가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투표를 마친 후
당선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지만,
- 국민의 말이 정치의 중심이 되지 않고,
- 의견은 반영되지 않으며,
- 참여는 어려워지고,
- 감시는 무뎌진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관객’이 된다.
주인의 자리는
말 잘하는 이들,
결탁된 이익 집단,
거대한 자본에게 조용히 되돌려진다.
민심은 강물이다 – 잠잠하지만 깊고, 때로는 모든 것을 휩쓸기도 한다
민심은 보통 조용하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와 관찰의 시간이다.
- 정치인의 말,
- 공약의 실행,
- 태도의 진실 여부를
국민은 생각보다 더 오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참을 수 없을 때, 마침내 방향을 바꾼다.
선거는 그 흐름이
분출되는 댐의 수문이 된다.
진짜 민주주의는 ‘선거 이후’에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함에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다.
- 내가 뽑은 이가
-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지,
- 정직한 정치에 서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말해야 한다.
주권은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 혐오가 아닌 정치 감시로
“다 똑같다.”
“뽑아봐야 소용없다.”
“정치는 더러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유일한 권력 행사 수단인 ‘투표’를 무력화시킨다.
정치 혐오는
결국 기득권에게 유리한 구조를 고착시킨다.
국민이 손을 놓으면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다.
주인은 항상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는
- 일상 속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 토론에 참여하고,
-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 공약 이행을 체크하고,
- 다시 책임을 묻는
끊임없는 ‘참여의 루틴’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헌법 속 문장이 아닌,
현실의 힘이 된다.
🌀 구독자와 함께 생각 나누기
- 여러분은 투표 이후, 정치가 얼마나 달라진다고 느끼시나요?
- 내가 던진 한 표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우리는 주인으로서 지금 어떤 감시와 참여를 해야 할까요?
생각을 나눠주세요.
주권은 함께 모일 때 더 강해집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일상의 휴식과 몸맘케어 > 감성 정치 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당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1) | 2025.05.10 |
|---|---|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1) | 2025.05.10 |
| 공정은 무엇인가 – 노력의 대가인가, 출발선의 평형인가 (3) | 2025.05.10 |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세금과 권리, 책임의 재구성 (3) | 2025.05.10 |
|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권력의 도구 혹은 약자의 방패? (1) | 2025.05.09 |
